|
 |
|
[살인의 추억] 그 허연 얼굴이, 내 등을... [cropper] |
 |
살인의 추억 |
|
|
 cropper
cropper
|
 2003-04-25 오후 6:36:00 2003-04-25 오후 6:36:00 |
 2605 2605 |
  [8] [8] |
|
|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다.
어떤 직업은 하릴없이 반복되는 작업의 연속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매 순간 창조적인
영감이 요구되는, 또 어떤 것은 경험이 밑천이 되는 것도 있다.
범죄현장의 사소한 물증으로부터 주변 인물들의 시시콜콜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형사들의 범인을 잡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는 자주 우리를 놀라게 만든다.
집요한 반복 작업과 번특이는 추리력, 풍부한 경험이 어우러져야만 가능한 산출물
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의 노고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영화 [살인의 추억]은 형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물론, 이 영화는 실제 화성 연쇄 살인사건을 다뤘다는 리얼리즘과 함께, 그 사건이
미결로 남을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과 수사의 부적절함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의 추억]은 스릴이나 즐기자고 15년이 다 지난 미결 사건을 끄집어
내 온 것도 아니고, 그 시대가 그 모양 그꼴이라서 범인을 잡지 못했노라고 푸념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 영화의 촛점은 철저하게도 바로 "그 들" - 형사들 - 에게 있다.
시위진압에 동원하느라 모자란 지원병력도, 열악한 수사환경도 살인마를 잡기 위한
[그 들]의 열정을 꺾지 못한다.
[살인의 추억]의 가장 큰 미덕은 "미치도록 잡고 싶었던" 사건 담당 형사들의 열정과
결국 빗물속에 흘려야만 했던 실패의 눈물에 있다.
가슴을 찡하게 하는 사랑의 이야기도 아니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의 노래
도 아닌데 이 영화의 엔딩 10 여분은 왜 그리도 필자의 주먹을 부들부들 떨게 하고,
왜 그리도 분통함에 입술을 깨물게 하는가..
토박이 형사 두만(송강호)과 서울 형사 태윤(김상경)의 티격태격으로 웃음짓게 하던
영화의 초반부를 지나 약간의 지루한 사건 전개를 펼친 중반부를 지나면, 어느 순간
에서부턴가 시나브로 고조된 감정의 묵직한 덩어리가 몸통을 죄여옴을 느끼게 된다.
결국, 끝나지 않은 사건의 끝으로 치달으면 -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
그 불안한 결말에서 오는 두려움과 슬픔에 몸서리를 치게 된다.
이 영화의 엔딩은 내가 앉은 객석 저만치 어디엔가 그 때 그 살인마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오싹함과, "미치도록 잡고 싶었으나" 잡지 못했던 그 때 그 형사들의 깊은 좌절
의 한숨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일찌기 경험해 본 적 없는 낯선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그리고, 조금도 모자람 없이 "바로 그 인물" 들을 표현한 배우들의 열연과 감독의
탁월한 장면 구성은 영화 내내 관객들을 스크린으로 함몰시키는 끊임없는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그러한 카타르시스가 뽑아져 나오게 하는 기반을 차곡차곡 만들어간다.
십수년의 시간은 살인조차 [추억]이 되게 하고, 무당 눈깔로 불리웠던 형사 두만의
눈총 조차 무뎌지게 했지만, 다시 찾아간 추억의 그 장소에서 살인자에 대한 실마리를
들었을 때 그 오랜 세월 묻혀 있던 "미치도록 잡고 싶었던" 분노는 침잠했던 화산의
용암처럼 그의 두 눈을 타고 터져 나올 것만 같다.
그 살인자도, 그 형사들도 이 시사회장 어딘가에서 그 때를 추억하며 미소짓고 있을지
모른다.
10 여년 전 쯤, 비오는 어둔 밤, 빨간색 차를 타고 경기도 화성의 어느 외진 길을
지나오던 그 귀가길의 공포가 지금 내 등뒤를 서늘하게 훝는다.
그 때 드물게 지나가던 비 옷입은 사내들의 허연 얼굴도...
Filmania CROPPER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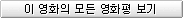
|
|
1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