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쥴리엣 비노쉬와 에밀쿠스트리챠...
영화를 보기 전에 그 둘이 감독과 배우가 아닌, 배우와 배우로 만났다는 사실이 이색적인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그 둘은 이내 우리에게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캐스팅이 아닌 '인간이 인간의 삶의
종결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우리의 가슴 안으로 훌륭히 던지는 역할을 하였
다.
사실, 사형제도의 존페여부는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닐 듯 싶다. 다만 이 영화
를 통해, 그러한 삶의 갈등에 대해 서로 마음으로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 아닐까...
영화를 본 후 함께 맥주 한잔을 들이키며, 영화에 대해 얘기를 나눈다.
뭐처럼 영화의 화두에 대해 함께 얘기를 나누며, 밤새 술잔을 나눌 수 있는 영화를 만난 듯
싶다.
진지하지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영화. 그것이 [길로틴 트레지디]의
매력인 듯 싶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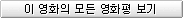
|
|
1
|
|
|
|
|
|
야드비가의 베개(2000, Jadviga's Pillow)
제작사 : Mafilm, Uj Dialog Studio / 배급사 : 예맥필름
수입사 : 예맥필름 /
1
|

|
